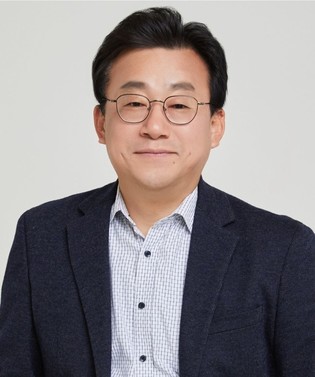담헌(澹軒) 이하곤(李夏坤) 선생님(1677년-1724년)의 식(識) 사상과
백운(白雲) 심대윤(沈大允) 선생님(1806년-1872년)의 이(利) 사상
[열린의정뉴스 = 열린의정뉴스] 필자는 지난 7호까지 연재해 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깨달음경영학'의 철학적 뿌리가 담헌(澹軒) 이하곤(李夏坤) 선생님(1677년-1724년)의 식(識) 사상과 백운(白雲) 심대윤(沈大允) 선생님(1806년-1872년)의 이(利) 사상에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담헌(澹軒)선생님과 백운(白雲)선생님은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실천적 위대한 민본(民本) 사상가, 둘째 진문(眞文) 즉 본질을 꿰뚫는 참된 학문과 고식(高識) 즉 높은 의식(意識)과 학문으로 깨달음 도(道)에 통달(通達)하신 선각자로서 관(官) 즉 권력에 영합함이 없는 신념, 셋째 몸소 실천하신 벤처사업가, 넷째 당시에 지체 높은 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관직(官職)을 사양하시며 단 한번도 하시지 않고 철저히 민간인(民間人)의 신분을 지키시면서 당대 시대를 선도하셨고 미래를 예견하시는 혜안으로 21 세기 얼 차린 자본주의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하신 크신 업적을 최근에야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학자들은 관존(官尊) 민비(民卑) 의식이 팽배하여 큰 벼슬하였던 선비들만을 중심으로 연구한 경향이 있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1). 담헌 이하곤 선생님의 '식(識)' 사상
담헌 이하곤 선생님은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완위각(宛委閣)'혹은 만권루(萬卷樓) 즉 수 만권의 책이 있는 누각이라는 뜻으로 불리는 민간 사립도서관 및 박물관과 교육장을 설립 운영하시며 당시에 민간 문헌 정보 벤처사업 경영과 당시 파쟁을 일삼는 당파의 화합과 탕평을 위한 문화 교육 탕평이념(蕩平理念) 사업(事業)에 심혈을 기울이시어 성공적으로 참다운 사람중심의 민간문화 및 교육 창달에 위대한 업적을 쌓으신 선각자 이십니다. 또한 당시 퇴행적 관존민비(官尊民卑) 의식(意識)과 귀천(貴賤)신분제도(身分制度)를 과감히 스스로 타파하셨고 모든 사회 신분계층 사람들과 공동 문화 교육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문화사회 민주사상을 온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이하곤은 당시에 선비(士)의 본직인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하곤은 일찍이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하셨으나 절대로 벼슬길 즉 관직(官職)에 나아가지 않으시고 평생 4번이나 주어지는 높은 벼슬 즉 관직(官職)을 끝내 사양하시면서 이로 인해 큰 오해도 받으면서도 선생님의 민본(民本)사상(思想)과 입덕(立德) 입언(立言) 즉 진문(眞文) 고식(高識)의 높은 인격의식과 학문 및 교육에 크신 업적을 남기셨고 그중 두타초(頭陀草) 18 책(冊)은 현재에도 국립도서관의 `귀중(貴重)고서(古書) 220호'로 소장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독서는 " 책 가운데 저절로 만 종의 녹이 들어있다"고 말할 만큼, 오직 과거를 보아 관인으로 출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하곤에게 "일평생의 독서는 과거 따내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남과 다른 면이라 하겠습니다.
이하곤은 당시 노론과 소론에 의해 치열하게 벌어진 당쟁의 와중에 함몰되지 않고 출세주의적 속류 학문과 구분되는 참다운 독서인으로서의 자세를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인들이 입덕(立德)과 입언(立言) 같은 불후의 사업에 마음을 써서 오늘날 세속 사람들이 오직 과거로 이록(利祿; 나라의 녹을 받는 일)만 일삼는 것과 다름을 알고, 일찍이 입언, 입덕 두 가지 일에 전념하여 이택(利澤; 이의 연못)이 당세에 흐르고 이름을 후세에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하곤은 '입덕·입언'을 인간이 성취한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바, 그 자신은 특히 '입언'의 뜻이 있었습니다. '입언'을 그는 '진문(眞文)'의 구현으로 보았으며, 이 '진문'을 이루는 것이 그의 필생의 포부였다. 그에게 '진문'이란 '인의·효제와 충신·예악의 도로 규정되는 유가적인 정치철학과 실천윤리로서 즉 경세문학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하곤은 이 '진문'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식(識)'을 중시했습니다. '문의 길은 반드시 식으로 근본을 삼는다'는 명제를 세워, "그 식(識)이 고매한 자는 그 문도 또한 고매하게 되며, 그 식(識)이 해박한 자는 그 문도 또한 해박하게 된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여기서 `식'은 의식 또는 지식 식견, 즉 높은 인격 의식과 문화 정치·사회적 견해를 뜻합니다. (중국 당나라의 역사이론가 유지기는 역사가의 필수로 `재才, 학學, 식識'의 삼장을 강조했는데, 이하곤 역시 '재'와 `학'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그는 선천적인 `재'보다는 `학'과 `식'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근학'을 `고식'의 과정으로 보고 고매한 식견, 해박한 지식이 흉중에 쌓이는 데 `근학'이 필수 과정이라고 보아, 학과 식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식'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하곤은 실제로 천지간의 만물·만사·유형·무형에 걸치는 광활한 의식과 지식과 지혜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가의 도리인 인의·효제와 충신·예악을 탐구의 중요한 항목으로 두었으나 지식이 거기서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폐쇄적·독선적인 학문 방법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2). 백운 심대윤의 `利' 사상
백운 심대윤의 집안은 고조부가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낼 만큼 유서 깊은 양반의 집안이었으나, 당쟁 싸움의 희생자로 집안 형편이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대윤은 안성 읍내에 들어가 반상(盤床)을 만드는 공방(工房)을 차려 생계를 이었으며, 약방도 경영했습니다. 당시로 볼 때는 너무도 파격적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천시받는 공인(工人), 상인(商人)으로 살면서 그는 국민의 복리(福利)를 구상하게 되었고, 그 체험적 진리에 따라 유교경전을 새롭게 해석해 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 연구 2005년 2월 발간한 심대윤(沈大允)전집(全集) 1.2.3 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대윤의 경학사상은 `복리(福利)' 두 자로 요약됩니다. 심대윤의 복리는 내세나 천상에서의 복리가 아니라 현세에서 지상에서 향유하는 복리입니다.
당시 조선왕조를 지배한 주자학 학문은 `천리를 보존하고(存天理) 인욕을 버린다(去人欲)'는 도덕주의적 명제를 앞세웠기 때문에 인욕(人欲)을 긍정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漢)나라의 대유 동중서(董仲舒)는 일찍이 "유자의 도리는 의(義)를 바로 하고 리(利)를 도모하지 않으며, 도(道)를 밝히고 공(功)을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유교는 인욕(人欲)을 부정하고 공리(功利)를 배격했습니다.
백운 심대윤은 말씀하시기를 "욕(欲)이야말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래적 천성이다(欲者, 天命之性也). 욕이야말로 성(性)과 심(心)과 정(情)의 주인이다. 인간이면서 욕이 없으면 목석(木石)과 무엇이 다르랴!" "도(道)는 필히 리(利)에 근본한다." "사람으로서 부(富)를 욕구하는 것은 천성이다. 인욕이 천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오래된 인간의 항상스러운 모습이다. 군자도 사람이다. 어찌 인간답지 못한 자라야 군자가 된다는 그런 엉터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과거 정통유학의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내뱉은 이가 바로 심대윤 이십니다.
심대윤은 대담하게 욕을 `천명의 성'이라고 하여 긍정하고 나섰고 심대윤이 `욕'을 인간조건으로 이해하고 `이의 추구'를 옹호한 논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현실적 인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호리(好利) 쟁리(爭利)가 아닌 동리(同利), 더 나아가서 복리(福利)를 그분의 유명한 복리전서(福利全書)에 피력하셨고 이로써 성리학(性利學)의 삼리(三利)를 주창하시어 당시의 성리학(性理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분의 윤리도덕관은 그야말로 현실주의적, 공리주의적 특징으로 뚜렷하며 오늘날 21세기 새로운 자본주의의 철학을 이미 그 옛날 제시하신 혜안을 높이 존경하게 됩니다.
3). 새로운 자본주의 건설과 개인경영, 가정경영, 기업경영, 사회경영, 국가경영, 지구 경 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식(識)과 이(利)로써 통찰하고 방안 실천
오늘날 세계 선진국가들을 위시하여 얼 빠진 자본주의의 파행적 행태와 국가경영 금융 및 실물 기업경영 가정경영 개인경영의 여러 모순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식(識)와 이(利)로써 이들을 극복하고 이겨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담헌(澹軒) 이하곤의 식(識)사상과 백운(白雲) 심대윤의 이(利)사상의 참다운 뜻과 취지를 재조명하고 미래의 개인경영의 각개인이 진정성과 온전함을 발전시키고 힘찬 생활을 하며 타인들과도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부분이오 전체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좋은 가정의 자생력(自生力), 좋은 직장 직업의 자구력(自求力), 좋은 사회 공존 공영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세계의 얼차린 자본주의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사회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및 공동체와 기업경영의 지속적 발전이 소비자와 투자자 지역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국경을 넘어 인류의 복리로써 양극화 빈곤 자원 고갈 지구 생태계 파괴 및 기후 변화 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간 의식경영(HCM: Humanitas Consciousness Management)을 중심으로 5차원의 '깨달음경영학'의 연구 교육 실천으로 제 5세대 경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21 세기의 새로운 5차원 문명세계 창달과 창조적 윤리의 인간을 양성해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함)
백운(白雲) 심대윤(沈大允) 선생님(1806년-1872년)의 이(利) 사상
 |
| ▲ 이재윤(李在潤)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 |
이번 호에서는 `깨달음경영학'의 철학적 뿌리가 담헌(澹軒) 이하곤(李夏坤) 선생님(1677년-1724년)의 식(識) 사상과 백운(白雲) 심대윤(沈大允) 선생님(1806년-1872년)의 이(利) 사상에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담헌(澹軒)선생님과 백운(白雲)선생님은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실천적 위대한 민본(民本) 사상가, 둘째 진문(眞文) 즉 본질을 꿰뚫는 참된 학문과 고식(高識) 즉 높은 의식(意識)과 학문으로 깨달음 도(道)에 통달(通達)하신 선각자로서 관(官) 즉 권력에 영합함이 없는 신념, 셋째 몸소 실천하신 벤처사업가, 넷째 당시에 지체 높은 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관직(官職)을 사양하시며 단 한번도 하시지 않고 철저히 민간인(民間人)의 신분을 지키시면서 당대 시대를 선도하셨고 미래를 예견하시는 혜안으로 21 세기 얼 차린 자본주의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하신 크신 업적을 최근에야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학자들은 관존(官尊) 민비(民卑) 의식이 팽배하여 큰 벼슬하였던 선비들만을 중심으로 연구한 경향이 있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1). 담헌 이하곤 선생님의 '식(識)' 사상
담헌 이하곤 선생님은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완위각(宛委閣)'혹은 만권루(萬卷樓) 즉 수 만권의 책이 있는 누각이라는 뜻으로 불리는 민간 사립도서관 및 박물관과 교육장을 설립 운영하시며 당시에 민간 문헌 정보 벤처사업 경영과 당시 파쟁을 일삼는 당파의 화합과 탕평을 위한 문화 교육 탕평이념(蕩平理念) 사업(事業)에 심혈을 기울이시어 성공적으로 참다운 사람중심의 민간문화 및 교육 창달에 위대한 업적을 쌓으신 선각자 이십니다. 또한 당시 퇴행적 관존민비(官尊民卑) 의식(意識)과 귀천(貴賤)신분제도(身分制度)를 과감히 스스로 타파하셨고 모든 사회 신분계층 사람들과 공동 문화 교육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문화사회 민주사상을 온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이하곤은 당시에 선비(士)의 본직인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하곤은 일찍이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하셨으나 절대로 벼슬길 즉 관직(官職)에 나아가지 않으시고 평생 4번이나 주어지는 높은 벼슬 즉 관직(官職)을 끝내 사양하시면서 이로 인해 큰 오해도 받으면서도 선생님의 민본(民本)사상(思想)과 입덕(立德) 입언(立言) 즉 진문(眞文) 고식(高識)의 높은 인격의식과 학문 및 교육에 크신 업적을 남기셨고 그중 두타초(頭陀草) 18 책(冊)은 현재에도 국립도서관의 `귀중(貴重)고서(古書) 220호'로 소장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독서는 " 책 가운데 저절로 만 종의 녹이 들어있다"고 말할 만큼, 오직 과거를 보아 관인으로 출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하곤에게 "일평생의 독서는 과거 따내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남과 다른 면이라 하겠습니다.
이하곤은 당시 노론과 소론에 의해 치열하게 벌어진 당쟁의 와중에 함몰되지 않고 출세주의적 속류 학문과 구분되는 참다운 독서인으로서의 자세를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인들이 입덕(立德)과 입언(立言) 같은 불후의 사업에 마음을 써서 오늘날 세속 사람들이 오직 과거로 이록(利祿; 나라의 녹을 받는 일)만 일삼는 것과 다름을 알고, 일찍이 입언, 입덕 두 가지 일에 전념하여 이택(利澤; 이의 연못)이 당세에 흐르고 이름을 후세에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하곤은 '입덕·입언'을 인간이 성취한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바, 그 자신은 특히 '입언'의 뜻이 있었습니다. '입언'을 그는 '진문(眞文)'의 구현으로 보았으며, 이 '진문'을 이루는 것이 그의 필생의 포부였다. 그에게 '진문'이란 '인의·효제와 충신·예악의 도로 규정되는 유가적인 정치철학과 실천윤리로서 즉 경세문학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하곤은 이 '진문'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식(識)'을 중시했습니다. '문의 길은 반드시 식으로 근본을 삼는다'는 명제를 세워, "그 식(識)이 고매한 자는 그 문도 또한 고매하게 되며, 그 식(識)이 해박한 자는 그 문도 또한 해박하게 된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여기서 `식'은 의식 또는 지식 식견, 즉 높은 인격 의식과 문화 정치·사회적 견해를 뜻합니다. (중국 당나라의 역사이론가 유지기는 역사가의 필수로 `재才, 학學, 식識'의 삼장을 강조했는데, 이하곤 역시 '재'와 `학'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그는 선천적인 `재'보다는 `학'과 `식'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근학'을 `고식'의 과정으로 보고 고매한 식견, 해박한 지식이 흉중에 쌓이는 데 `근학'이 필수 과정이라고 보아, 학과 식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식'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하곤은 실제로 천지간의 만물·만사·유형·무형에 걸치는 광활한 의식과 지식과 지혜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가의 도리인 인의·효제와 충신·예악을 탐구의 중요한 항목으로 두었으나 지식이 거기서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폐쇄적·독선적인 학문 방법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2). 백운 심대윤의 `利' 사상
백운 심대윤의 집안은 고조부가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낼 만큼 유서 깊은 양반의 집안이었으나, 당쟁 싸움의 희생자로 집안 형편이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대윤은 안성 읍내에 들어가 반상(盤床)을 만드는 공방(工房)을 차려 생계를 이었으며, 약방도 경영했습니다. 당시로 볼 때는 너무도 파격적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천시받는 공인(工人), 상인(商人)으로 살면서 그는 국민의 복리(福利)를 구상하게 되었고, 그 체험적 진리에 따라 유교경전을 새롭게 해석해 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 연구 2005년 2월 발간한 심대윤(沈大允)전집(全集) 1.2.3 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대윤의 경학사상은 `복리(福利)' 두 자로 요약됩니다. 심대윤의 복리는 내세나 천상에서의 복리가 아니라 현세에서 지상에서 향유하는 복리입니다.
당시 조선왕조를 지배한 주자학 학문은 `천리를 보존하고(存天理) 인욕을 버린다(去人欲)'는 도덕주의적 명제를 앞세웠기 때문에 인욕(人欲)을 긍정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漢)나라의 대유 동중서(董仲舒)는 일찍이 "유자의 도리는 의(義)를 바로 하고 리(利)를 도모하지 않으며, 도(道)를 밝히고 공(功)을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유교는 인욕(人欲)을 부정하고 공리(功利)를 배격했습니다.
백운 심대윤은 말씀하시기를 "욕(欲)이야말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래적 천성이다(欲者, 天命之性也). 욕이야말로 성(性)과 심(心)과 정(情)의 주인이다. 인간이면서 욕이 없으면 목석(木石)과 무엇이 다르랴!" "도(道)는 필히 리(利)에 근본한다." "사람으로서 부(富)를 욕구하는 것은 천성이다. 인욕이 천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오래된 인간의 항상스러운 모습이다. 군자도 사람이다. 어찌 인간답지 못한 자라야 군자가 된다는 그런 엉터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과거 정통유학의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내뱉은 이가 바로 심대윤 이십니다.
심대윤은 대담하게 욕을 `천명의 성'이라고 하여 긍정하고 나섰고 심대윤이 `욕'을 인간조건으로 이해하고 `이의 추구'를 옹호한 논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현실적 인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호리(好利) 쟁리(爭利)가 아닌 동리(同利), 더 나아가서 복리(福利)를 그분의 유명한 복리전서(福利全書)에 피력하셨고 이로써 성리학(性利學)의 삼리(三利)를 주창하시어 당시의 성리학(性理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분의 윤리도덕관은 그야말로 현실주의적, 공리주의적 특징으로 뚜렷하며 오늘날 21세기 새로운 자본주의의 철학을 이미 그 옛날 제시하신 혜안을 높이 존경하게 됩니다.
3). 새로운 자본주의 건설과 개인경영, 가정경영, 기업경영, 사회경영, 국가경영, 지구 경 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식(識)과 이(利)로써 통찰하고 방안 실천
오늘날 세계 선진국가들을 위시하여 얼 빠진 자본주의의 파행적 행태와 국가경영 금융 및 실물 기업경영 가정경영 개인경영의 여러 모순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식(識)와 이(利)로써 이들을 극복하고 이겨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담헌(澹軒) 이하곤의 식(識)사상과 백운(白雲) 심대윤의 이(利)사상의 참다운 뜻과 취지를 재조명하고 미래의 개인경영의 각개인이 진정성과 온전함을 발전시키고 힘찬 생활을 하며 타인들과도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부분이오 전체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좋은 가정의 자생력(自生力), 좋은 직장 직업의 자구력(自求力), 좋은 사회 공존 공영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세계의 얼차린 자본주의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사회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및 공동체와 기업경영의 지속적 발전이 소비자와 투자자 지역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국경을 넘어 인류의 복리로써 양극화 빈곤 자원 고갈 지구 생태계 파괴 및 기후 변화 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간 의식경영(HCM: Humanitas Consciousness Management)을 중심으로 5차원의 '깨달음경영학'의 연구 교육 실천으로 제 5세대 경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21 세기의 새로운 5차원 문명세계 창달과 창조적 윤리의 인간을 양성해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함)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