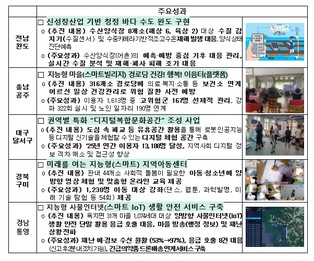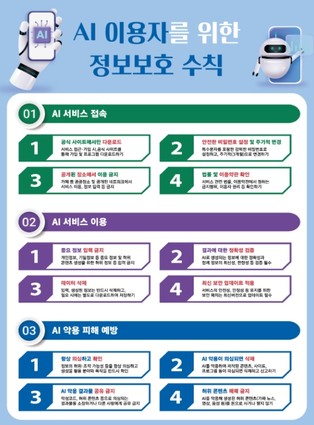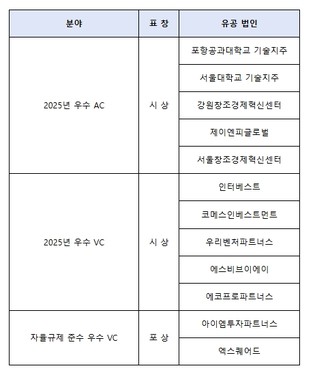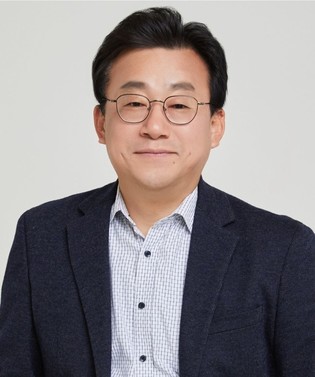10. “얼 차린 자본주의 새 길”을 찾다
[열린의정뉴스 = 열린의정뉴스] `깨달음경영학'에 관한 연재 10회 입니다. 지난 호 에서 이미 설명 드린 `깨달음경영학'의 철학적 뿌리인 담헌 (澹軒) 이하곤(李夏坤) 선생님(1677년-1724년)의 식(識) 사상과 백운 (白雲) 심대윤(深大允) 선생님(1806년-1872년)의 이(利) 사상에 기초하여 이번과 다음 호에서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여 `얼 차린 자본주의의 새 길을 찾다'를 2번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운 심대윤 선생님의 성리학(性利學)과 삼리사상(三利思想)과 복리주의(福利主義)를 통해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복리사회(福利社會)를 건설하는 “얼 차린 자본주의의 새 길”을 제시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와 심대윤의 성리학(性利學)
도덕과 경제는 사회를 유지하는 두 축이다 동양의 유, 불, 도 세가지 교는 도덕으로 상징되는 반면 서구의 현대 자본주의는 경제로 상징 된다 도덕을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동양사상과 경제를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는 서구 자본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쌍두마차와 같아서 서로 접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심대윤은 동양의 5,000년 역사상에서 유일하게 性利學을 창시한 인물이다 의(義)와 이(利)를 나누어 義를 존중하고 利를 경시한 것이 공맹 유학이고 리(理)와 이(利)로 구분하여 이익을 배격하고 천리를 추구한 것이 정주의 성리학(性理學)이다.
심대윤의 성리학(性利學)은 인간의 욕망을 天命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천성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이윤 창출을 인간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상당한 근사치를 발견한다.
심대윤의 性利學은 그 기본 방향에서 자본주의와 크게 이질적이지 않고 상호 충돌적인 요소가 적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데 있어 다른 동양의 사상에 비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와 심대윤의 삼리사상(三利思想) 인간의 욕망을 천명으로 인정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인간의 천성으로 간주한 심대윤의 사상은 정주의 성리학(性理學) 입장에서 본다면 파격을 넘어 반역에 가까운 것이며 오히려 현대 자본주의 이론체계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심대윤의 성리학(性利學)이 정주의 성리학(性理學)과 달리 인간의 욕망과 이익을 부정하지 않고 이를 긍정한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현대 자본주의와 상통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론상에서는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심대윤은 호리(好利), 동리(同利), 복리(福利)의 삼리사상(三利思想)을 제창하였다 인간이 이익을 좋아하는 것 즉 好利는 인간의 천성으로서 이는 회피하거나 거부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추구하고 구현 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익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천성으로서 탐욕을 부리거나 자기 혼자서 이익을 독점하려 드는 쟁리(爭利)를 반대하고 이익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동리(同利)를 제창하였다.
이해는 서로 상충되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를 공유할 수 있는가 심대윤은 인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이익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구현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간직한 존재이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미루어 남과 함께 나누는 충(忠)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요구하지 않는 서(恕)를 그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다.
정주의 性理學에서는 충서(忠恕)를 이(理)를 구현하는 방법론으로서 설명하였는데 심대윤은 性利學의 관점에서 이(利)를 함께 나누는 同利의 방법론으로서 忠恕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 심대윤의 性利學이 好利, 同利를 지나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한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福利였다 福利란 무엇인가 행복과 이익이 俱全한 상태를 가리킨다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福利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심대윤 性利學의 목표요 꿈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好利, 爭利, 獨利로 규정할 수 있다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사회전체의 효용성을 극대화 한다”라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자본주의의 好利적인 시각을 잘 대변 한다.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약육강식의 경쟁적인 쟁리(爭利) 현상이 나타나고 무절제한 탐욕 속에 최상위 1%가 이익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의 독리(獨利) 현상이 보편화 된 것이 오늘 자본주의 일그러진 얼굴이다.
그런 점에서 호리(好利), 동리(同利), 복리(福利)를 추구하는 심대윤의 사상은 호리(好利), 쟁리(爭利), 독리(獨利)로 규정되는 오늘의 자본주의와 출발은 같지만 목표와 방법론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장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심대윤의 삼리사상(三利思想)은 좋은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와심대윤의 복리주의(福利主義)
심대윤은 학문이 완숙의 경지에 이른 57세 때 자신의 사상을 개괄하여 한 책에 담아 기술하고 그 책 이름을『복리전서(福利全書)』라고 하였고 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책 가운데 기록한 것은 다 상고시대 성인들의 미묘한 요결이고 나의 사사로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진실로 성심으로 읽고 정밀하게 생각하여 가슴속 깊이 새겨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한량없는 복리를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유교에서 지칭하는 성인(聖人)은 통상 공맹(孔孟)을 가리킨다 그러나 심대윤은 여기서 그냥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인이라는 명사 앞에 상고(上古)라는 용어를 덧붙였다.
공맹은 춘추전국시대의 인물로 춘추전국시대를 상고시대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심대윤이 말하는 성인은 공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맹 이전의 상고시대의 성인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고시대의 성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주공, 공자 이전의 복희, 신농, 요, 순, 은탕(殷湯) 이런 분들이 심대윤이 말하는 상고시대의 성인에 해당할 것이다. 이들은 공맹이 사상적 원류로 추앙한 공맹 유학 이전 원시유학의 성인들이고 중국의 서화(西華) 유학이전 동이(東夷) 유학의 성인들이다.
심대윤의 사상이 상고시대 성인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익을 좋아하는 것을 인간의 천성으로 제시하면서 그 근거를 『서경(書經)』의 “하늘이 백성을 내시니 그들은 태생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다.(天生民有欲)”라고 말한 것에 두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는 여기에 기초하여 “욕망은 하늘이 명한 본성이다.(欲者 天命之性也 )” <『심대윤전집』1, 「복리전서」 P134> “사람이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본성이 되었으니 그것을 욕망이라고 한다.(人稟天地之氣 而爲性 曰欲)” <『심대윤전집』1, 「복리전서」, P135> 와 같은 논리를 전개했다.
심대윤은 인의를 높이고 이익을 경시한 공맹의 주장, 천리를 본성으로 인정하는 정주의 성리학(性理學)적인 주장을 따르지 않고 공맹 이전의 원시 유학으로 돌아가 “욕망은 하늘이 명한 본성이다(欲者 天命之性也)”라는 독창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정신적 행복과 물질적 풍요가 함께하는 복리사회를 실현하기를 꿈꾸었다.
심대윤이 주장한 복리의 개념은 현대 시장 자본주의가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향하는 복지의 개념보다 의미상에서 볼 때 한 층 더 아름다운 개념이다.
`복지(福祉)'는 福자와 祉자가 모두 행복을 뜻하는 내용으로 물질적 이익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 자본주의가 사리사욕을 지향하는 폐단이 있다고 해서 다시 지나치게 복지 쪽으로 편향되어 나간다면 새로운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적은 근로시간, 긴 휴가, 무상급식 등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유럽식 자본주의가 그것을 잘 증명 한다.
(다음호에 계속)
 |
| ▲ 이재윤 박사 |
백운 심대윤 선생님의 성리학(性利學)과 삼리사상(三利思想)과 복리주의(福利主義)를 통해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복리사회(福利社會)를 건설하는 “얼 차린 자본주의의 새 길”을 제시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와 심대윤의 성리학(性利學)
도덕과 경제는 사회를 유지하는 두 축이다 동양의 유, 불, 도 세가지 교는 도덕으로 상징되는 반면 서구의 현대 자본주의는 경제로 상징 된다 도덕을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동양사상과 경제를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는 서구 자본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쌍두마차와 같아서 서로 접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심대윤은 동양의 5,000년 역사상에서 유일하게 性利學을 창시한 인물이다 의(義)와 이(利)를 나누어 義를 존중하고 利를 경시한 것이 공맹 유학이고 리(理)와 이(利)로 구분하여 이익을 배격하고 천리를 추구한 것이 정주의 성리학(性理學)이다.
심대윤의 성리학(性利學)은 인간의 욕망을 天命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천성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이윤 창출을 인간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상당한 근사치를 발견한다.
심대윤의 性利學은 그 기본 방향에서 자본주의와 크게 이질적이지 않고 상호 충돌적인 요소가 적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데 있어 다른 동양의 사상에 비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와 심대윤의 삼리사상(三利思想) 인간의 욕망을 천명으로 인정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인간의 천성으로 간주한 심대윤의 사상은 정주의 성리학(性理學) 입장에서 본다면 파격을 넘어 반역에 가까운 것이며 오히려 현대 자본주의 이론체계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심대윤의 성리학(性利學)이 정주의 성리학(性理學)과 달리 인간의 욕망과 이익을 부정하지 않고 이를 긍정한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현대 자본주의와 상통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론상에서는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심대윤은 호리(好利), 동리(同利), 복리(福利)의 삼리사상(三利思想)을 제창하였다 인간이 이익을 좋아하는 것 즉 好利는 인간의 천성으로서 이는 회피하거나 거부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추구하고 구현 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익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천성으로서 탐욕을 부리거나 자기 혼자서 이익을 독점하려 드는 쟁리(爭利)를 반대하고 이익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동리(同利)를 제창하였다.
이해는 서로 상충되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를 공유할 수 있는가 심대윤은 인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이익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구현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간직한 존재이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미루어 남과 함께 나누는 충(忠)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요구하지 않는 서(恕)를 그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다.
정주의 性理學에서는 충서(忠恕)를 이(理)를 구현하는 방법론으로서 설명하였는데 심대윤은 性利學의 관점에서 이(利)를 함께 나누는 同利의 방법론으로서 忠恕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 심대윤의 性利學이 好利, 同利를 지나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한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福利였다 福利란 무엇인가 행복과 이익이 俱全한 상태를 가리킨다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福利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심대윤 性利學의 목표요 꿈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好利, 爭利, 獨利로 규정할 수 있다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사회전체의 효용성을 극대화 한다”라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자본주의의 好利적인 시각을 잘 대변 한다.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약육강식의 경쟁적인 쟁리(爭利) 현상이 나타나고 무절제한 탐욕 속에 최상위 1%가 이익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의 독리(獨利) 현상이 보편화 된 것이 오늘 자본주의 일그러진 얼굴이다.
그런 점에서 호리(好利), 동리(同利), 복리(福利)를 추구하는 심대윤의 사상은 호리(好利), 쟁리(爭利), 독리(獨利)로 규정되는 오늘의 자본주의와 출발은 같지만 목표와 방법론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장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심대윤의 삼리사상(三利思想)은 좋은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와심대윤의 복리주의(福利主義)
심대윤은 학문이 완숙의 경지에 이른 57세 때 자신의 사상을 개괄하여 한 책에 담아 기술하고 그 책 이름을『복리전서(福利全書)』라고 하였고 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책 가운데 기록한 것은 다 상고시대 성인들의 미묘한 요결이고 나의 사사로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진실로 성심으로 읽고 정밀하게 생각하여 가슴속 깊이 새겨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한량없는 복리를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유교에서 지칭하는 성인(聖人)은 통상 공맹(孔孟)을 가리킨다 그러나 심대윤은 여기서 그냥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인이라는 명사 앞에 상고(上古)라는 용어를 덧붙였다.
공맹은 춘추전국시대의 인물로 춘추전국시대를 상고시대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심대윤이 말하는 성인은 공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맹 이전의 상고시대의 성인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고시대의 성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주공, 공자 이전의 복희, 신농, 요, 순, 은탕(殷湯) 이런 분들이 심대윤이 말하는 상고시대의 성인에 해당할 것이다. 이들은 공맹이 사상적 원류로 추앙한 공맹 유학 이전 원시유학의 성인들이고 중국의 서화(西華) 유학이전 동이(東夷) 유학의 성인들이다.
심대윤의 사상이 상고시대 성인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익을 좋아하는 것을 인간의 천성으로 제시하면서 그 근거를 『서경(書經)』의 “하늘이 백성을 내시니 그들은 태생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다.(天生民有欲)”라고 말한 것에 두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는 여기에 기초하여 “욕망은 하늘이 명한 본성이다.(欲者 天命之性也 )” <『심대윤전집』1, 「복리전서」 P134> “사람이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본성이 되었으니 그것을 욕망이라고 한다.(人稟天地之氣 而爲性 曰欲)” <『심대윤전집』1, 「복리전서」, P135> 와 같은 논리를 전개했다.
심대윤은 인의를 높이고 이익을 경시한 공맹의 주장, 천리를 본성으로 인정하는 정주의 성리학(性理學)적인 주장을 따르지 않고 공맹 이전의 원시 유학으로 돌아가 “욕망은 하늘이 명한 본성이다(欲者 天命之性也)”라는 독창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정신적 행복과 물질적 풍요가 함께하는 복리사회를 실현하기를 꿈꾸었다.
심대윤이 주장한 복리의 개념은 현대 시장 자본주의가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향하는 복지의 개념보다 의미상에서 볼 때 한 층 더 아름다운 개념이다.
`복지(福祉)'는 福자와 祉자가 모두 행복을 뜻하는 내용으로 물질적 이익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 자본주의가 사리사욕을 지향하는 폐단이 있다고 해서 다시 지나치게 복지 쪽으로 편향되어 나간다면 새로운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적은 근로시간, 긴 휴가, 무상급식 등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유럽식 자본주의가 그것을 잘 증명 한다.
(다음호에 계속)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